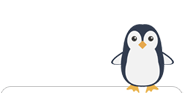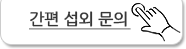인간의 호기심은 늘 우주로 나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의 근원에 대한 호기심, 인류를 비롯한 생명체의 근원에 대한 호기심은 우리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인 우주를 탐색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2019년은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은 지 5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인류의 달착륙 이후 앞으로 다가올 우주탐사 50년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우리의 현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은 1992년에 발사된 우리별 1호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은 1957년에 발사된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지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의 역사는 우주 선진국과 이미 35년의 차이가 출발선에서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개발과 탑재체 개발은 이미 상당부분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한참 후발주자인 발사체 분야에서도 최근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요. 인류가 만든 인공위성 들 중에서 가장 멀리 까지 나가 있는 위성은 태양권계면에 도착한 보이저 1, 2호입니다. 인류가 우주로 보낸 인공위성들이, 인간의 우주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위성은 사실상 현대과학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첨단 기술력의 산물입니다. 우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거대한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과 전력 안에서 원하는 기능들을 모두 구현해야 합니다. 우주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낮과 밤의 온도차(-100℃~100℃)를 견뎌야 하고, 우주방사선으로부터의 피폭도 견뎌야 합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지상 실험을 거치지만, 모든 위성의 발사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기술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위성 기술도 발달해서, 위성을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손바닥 위에도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의 인공위성을 큐브샛이라고도 하지요. 이번 강연에서는 제가 만들고 있는 SNIPE 위성을 소개하겠습니다.
|